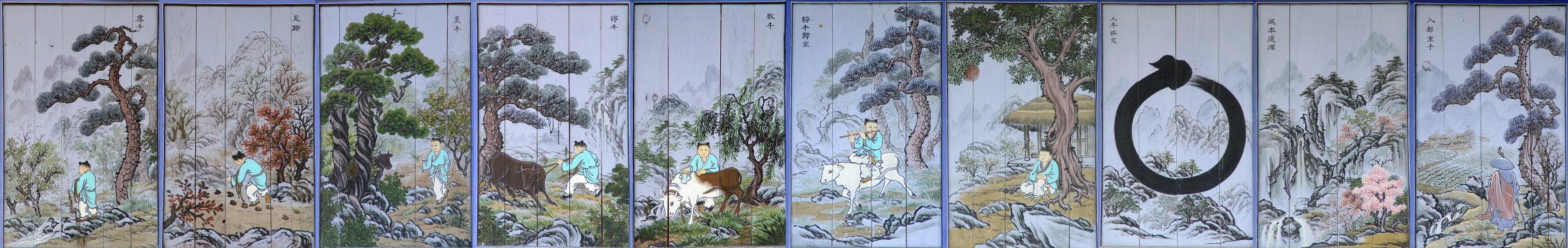이동식선생과의 대화(허찬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05-27 17:11본문
※ 2003년 8월 3일 한국정신치료학회 사무실에서, 한국정신치료학회 (당시) 허찬희 국제교류위원장이 이동식 선생님과 대담한 내용을 녹취한 기록이며, 2004년 8월 이동식선생님께서 교정을 보신 글입니다.
소암 이 동식 선생과의 대화(허 찬희)
일시 : 2003년 8월 3일 오후2시
장소 : 한국정신치료학회 사무실
H(허찬희) : 아무래도 '道精神治療'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선생님의 정신치료 경험을 시작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R(이동식) : 그것은 전에 늘 얘기 했듯이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입학 전에 숙모가 스물 대살 되었는데 막 울고 불고 하는 걸 보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감정 처리 여하에 달렸다', '감정에 좌우되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남이 나쁜 짓을 해도 반드시 과거에 그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남하고 싸우거나 공격을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다. 물론 (내가) 공격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지, 그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공격하지만 안 그런 공격을 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하고 뭔가 생각하는 게 만날 거꾸로 간다. 좋은 예로, 일본 및 외국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나은데, 국민성이나 문화 등 여러 가지가. 그러나 남들은 자꾸 서양, 중국, 일본이 낫다고 야단이야
H : 그걸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까?
R : 그렇지, 어릴 때부터. 해방 후에도, 해방이 된지 오래 됐는데 딴 사람들은 변경이 안 된다 이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안 변했고 다른 사람도 안 변했다 이거지, 일제시대부터', 이런 결론이 났다. 국민학교 때 뒷집에 친구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내가 함께 있는 앞에서 '동식이는 꼭 중 같다. 인생에 대해서 환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10살 전후에 사람들이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선자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또한 남하고 견해가 달랐다. 국민학교 때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한번 딱 보고 알았다. 20대 전후에 술 마시러 가서 여자들이 몇 살이다고 하면 틀림없고, 확실치 않으면 내가 손을 만져보거든. 피부를 만져 보고 몇 살이라고 하면 틀림없었다. 미국에 있을 때 환자를 보고 몇 년 전에 정신분열병 발병했다고 하면 딱 정확하게 맞았다.
H : 그 후 정신의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경험이 진행되었는지요?
R : 정신의학 하기 전에 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죽었지만 Kurt Kolle, 뮌헨 대학 교수의 독일 교과서에 Kleine Hypnose라고 일상생활에서 최면술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평소에 최면술 잘 거는 친구가 있어서 여자 잘 꼬시고 그걸 실제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죽었지만 친구 하숙비 올라오면 알고 와서 노래 부르고 분위기 잡다가 최면 걸렸다 싶으면 '자! 가자'고 하면서 술집에 가게 된다. 그 친구 오면 돈 털린다는 것 알면서도 결국 최면에 걸리거든. 그래서 정신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정신과에서 별 치료방법도 없고 단지 Insulin 치료, 전기 치료 그리고 흥분하면 Scopolamine 주사 놓거나, 유황유를 끓여 주사를 놓아 아프게 하는 것 그런 것 밖에 없었다. 정신분석 책 읽어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게 인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두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을 추구하는 데 아무리 읽어도 현실이 안 나온다 말이야. 미국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도 Anxiety에 대해서 Report 내라고 하는데 내가 도저히 쓸 수 없어 안 썼다. 전부가 개념이라, 나는 현실을 추구하는데,
H : 그러면 정신의학을 하면 그 어떤 정신치료적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기대를 하시고 시작했습니까?
R : 있었지, Kolle 책에도 정신치료가 있었지. 그때 정신분석이다, 최면술, 설득요법, 암시요법 등이 있었지. 나는 환자를 볼 적에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때는 책에 있는 증상을 적고 진단 붙이고 전기 치료하고 이런 것, 별로 약도 없고, Bromide 제제 그런 것 밖에 없고, 별로 약도 없고 없던 그런 시대야, 그러니깐 혼자 환자 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금방 이해가 안됐지. 그런데 당시 '정신분열병의 증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이야. 그런데 Binswanger의 현상학적 현존재분석이 대두되어 내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인간의 Innere Lebens Geshichte, inner life history를 강조하였다. 보통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외부에 나타나는 행동을 관찰 하는 거지. 마음속은 제외되어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적 생활사,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지. 그런 노력을 하다가 해방 전후에 30대 여자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진찰 해보니 첫날밤에 남편이 임질을 옮겨서 그것 때문에 불임증이 되었다, 그래서 자녀를 보기 위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집에 두고 함께 산지가 8년이 되었다고 했다. 첩과 함께 같은 집에 사니까 머리가 안 아플 턱이 없다고 내가 공감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대구 피난 가서 심인성 두통 사례를 정신치료 했다. 그것이 최초로 (정신치료한 사례다). 대구 피난 갈 때 Franz Alexander와 French(Thomas Morton French)의 Psychoanalytic Therapy와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그것 딱 두 권을 갖고 갔거든. 딴 것은 다 없어지고. 그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Alexander 책을 읽었지. 그 영향이 있을 거야 아마
H : 그게 몇 년도?
R : 1953년. 머리가 아파서 처음에는 Aspirin 먹으면 괜찮다가 나중에는 듣지 않게 되어 6개월간 모 정신 병원에서 물약을 먹었으나 일시적 효과뿐이었다. '정신치료 정신위생상담'이란 간판을 보고 상담 받으러 왔다. 처음에 interview 하니 원인이 안 나와서 다음에 뭐든지 속에 있는 것 다 얘기해야 된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좀 털어놓고 12번에 걸쳐 단기 정신치료를 통하여 심인성 두통이 치료되었다. 그 때 판단한 게 그대로다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두통은 12번 interview해서 나았지만 Basic Personality는 장기치료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H : 선생님은 정신의학 시작할 당시부터 벌써 정신치료적인 정신의학에서 출발을 했네요. 요새는 정신약물 치료를 전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R : 나는 정신 치료만 한다 이게 아니라 환자를 고친다 이거야. 정신치료다 약물치료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Graeme Taylor (1997)도 내 치료에 대해서 서양의 모든 이론과 technique이 다 들어 있다고 했다. 자세히 읽어보라. 그런 방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약이 필요하면 약 주고, 전기치료가 필요하면 하고 그걸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모든 게 다 내가 예견한대로 나가고 있다.
H : 환자의 고통을 해결 해준다는 것으로 출발하니까 결국은 발전적으로 나가게 되었다.
R : 방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도 (The article about the lecture of Kandel) 나와 있고, Time지에도 나와 있지만 인제 모든 게 다 내가 예기한대로 되고 있다. 도 그리고 정신치료가 신경과학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H : 한국에서 그렇게 경험하시다가 1954년 선생님이 미국에 4년 정신치료 공부 하러 가시고 돌아오셔서 도에 관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특별한 깨달음의 확장에 큰 계기나 성장에 큰 계기가 있었습니까? 혹은 꾸준하게 성장하신 건지?
R : 원래 도에 대한 관심은, 서양에 정신분석에서 떠들어대는데 우리도 그것과 비슷한 게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최고 궁극적인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말하자면, 우리는 26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했는데 서양은 19세기에 와서 무의식을 발견하고
H :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했구만요? 동서양 전체 입장에서 도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미국 가서도 더 확실히 확인을 한 셈이군요? 그 쪽에 정신분석 공부하러 가셨지만 더 증명이 된 셈이다.
R : 그렇지. 또한 미국에 가서도 임상정신과 의사로서도 거기 病棟長이 왜 내가 Senior Psychiatrist가 안되냐고 밤낮 그러더라, 자기보다 실력이 낫다고 하고, 또 딴 병동장도 진단이 자기하고 같다고 하면서 80%는 똑같은데 20% 틀린 거는 견해차다. 그래서 병동장들보다 내가 실력이 위다 이거지. 김수곤이가 미국 가기 전에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한 군의관이 Bellevue에 가서 병리 공부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Dr. Rhee 아느냐고 해서 모른다고 하니, 'Dr. Rhee가 excellent psychiatrist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게 다른 科 의사들이 이상 없다는 것을 내가 Organic Brain Syndrome으로 진단한 게 확인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직 제자들한테도 아직 전수도 못했다고, 아무한테도, 경도제대 나온 일본 정신과 의사가 자기 아버지가 오사카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있는데 돌아 올 때 내가 갔더니,- 미국 본토에서 Dr. Rhee가 Bellevue에서 Clinical Eye가 제일 sharp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 사람들이 진단 못하는 것을 내가 하니까, 그런 게 많거든,
H :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나중에 핵심이 전달이 잘 되야 되는데-
R : 그게 문제야, 지금 모두 딴 데 엉뚱한데 가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깐 마음과 신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모두 뇌의 병이다 캐샀잖아(라고 하고 있잖아) Kandel (Eric Kandel, Kandel Uses Lecture to Change Minds of Psychiatrists by Jim Rosack, Psychiatric News; XXXVI, Number 12; June 15, 2001)이 40년간 연구해서 증명한 거지. 뇌라는 것은 메모리와 experience 에 의해서 shape 된다.
H : 요새 정신과 의사들의 견해는 Psychoses는 Organic Disease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R : 그렇지, 그것도 최근 지식에도 뒤떨어진 생각이다
H : 물론 Organic Change가 왔지만 경험에 의해서 변화가 온 거다. 경험에 의해서 뇌의 변화가 왔다는 사실은 생략되고, 결과로서 생긴 뇌의 변화만 생각한다.
R : 그렇지, 노벨상 받은 Kandel이 연구한 거다. 정신치료란 건 새로운 경험, Alexander가 말하는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를 제공하는 거다.
H : 새로운 경험과 기억들이 뇌의 새로운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R : 그렇지, 도 정신치료라는 게 그거지. 환자는 동토에 벌벌 떨고 있는데 치료자가 봄을 갖다 준다. 봄이라는 게 자비심, 자비심으로 치료를 한다.
H : 그런데 도 정신치료가 특별히 정신분열병 치료에 다른 게 있는지?
R : 정신분열병이나 모든 정신 장애가 같다 이거지. 같다는 것은 자비심, 자비심으로써 치료가 된다. 자비심이 있어야 공감이 된다. 말하자면 공감적인 응답으로 치료가 된다. Empathic Failure, 즉 자랄 때 부모, 어머니의 공감적인 응답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된다.
H : 그런데 증상을 보면 정신병 환자들은 노이로제에 비해서 비합리적 비논리적 증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 정신치료에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R : 그게 서양 사람도 소위 Pregenital, 아주 어릴 적에 상처를 받으면 정신병이 되고 Oedipal period, 만 3세 이후는 노이로제가 된다. 어떤 발달 단계에서 상처를 받았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정신치료는 그런 환자의 느낌을, 치료자의 자비심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정서적 발달 단계에 맞는 부분을 응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정신병은 더 어린 단계 거기가 약하다,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한다. 쉽게 말해서 노이로제 같으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지만 정신병 같으면 치료가 몇 년씩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치료자가 알아도, 근기에 맞추어서 치료해야 되는데, 근기라는 게 중요한 거다.
H : 그 점은 서양 정신 치료자들의 견해와 거의 비슷한데?
R : 그렇지 비슷한 점이 많지
H : 발달 단계에서 더 이른 시기의 장애다
R : 그렇지, 효과 있는 치료인 경우는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환자의 느낌을, 느낌으로서 치료한다. 그거다. 불교에서 수연응기제도(隨緣應機濟度), 거기 정신치료의 원리다. 수연-관계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환자의 근기에 맞추어서, 발달단계 또는 Ego Strength, 'Ego Strength = (equal) 발달단계'라 말이야. 'Ego Strength'와 '치료자와 환자와의 관계', 그게 정신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좌우한다. 말하자면 발달단계가 같은 환자라도 치료자와 관계가 다르면 달라진다. 믿는 관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약하면 똑 같은 그것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두 가지 요인. 관계와 근기(발단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H : 관계는 결국 치료자의 인격의 힘과 관계가 있다.
R : 그렇지, 지지하는 원동력
H :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서양에도 경험 많은 정신치료자들의 치료나 견해와 같다
R : 정신치료 잘 하는 사람은 자기네끼리도 서로 잘 안다고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경험에는 다름이 없는데 서양 사람은 경험을 한 후에 자꾸 이론을 만든다. 거기서부터 갈라진다. Arthur Trenkel 편지에도 그런 게 있지. 경험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경험을 해 가지고 자꾸 개념화하고 이론화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와 갈라진다.
H :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하실 때에는 외국 사람들이 그때는 딱 알아채는데 그 다음에 또 개념화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에게 그런 것을 개념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면 서양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쉽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서양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드해줄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R : 그렇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 사람들의 통역이 필요하다. 내가 1977년 하와이에서 발표했을 때 질문하는 것마다 모두 Conceptual thinking이더라. 모든 질문에 대해 내가 답변을 안하고, 그것은 개념적 사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에 차이가 있다.
(편집자 삽입)
"The Tao, Psychoanalysis and Existential Thought," 6th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Honolulu, Hawaii
H : 그런데 서양 사람들도 선생님의 정신치료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어떤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R : 그렇지 Allan Tasman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에게 소개를 잘 해줄 수 있는 서양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H : 학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다.
R : 그런 모임을 갖는 것dl 좋다, 예를 들어 서양 사람 모아가지고 서양 정신치료와 도 정신치료를 토론하는 게 좋다.
H : 얼마 전에 싱가폴 학회에 갔을 때 청중 한 사람이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 돌아와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개념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개념을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마치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아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
R : 그렇지, 그러니까 William Barrett가 Conceptual Prison, 개념의 감옥에 갇혀있다. 그것을 다시 읽어보지. 서문을. 감옥을 못 벗어났다, 서양 철학도 그거다, 개념을 빼놓으면 없다 이거지. 우리는 '개념은 현실을 가리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을 봤으면 개념은 잊어버려라'라고 하는데. //도 정신치료의 경우 핵심 감정의 이해가 근본이거든, 핵심감정과 자비심, 그런데 핵심감정도 노이로제나 정신병, 어떤 정신병이라도 다 그걸 다루면 빨리 낫고 재발이 안 된다. 정신분열병을 예로 든다면, 해방 직후 지리멸렬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를 첨 봤거든, 청량리 뇌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도 안 나은 환자인데 병실에서 서서 2-3분 인터뷰했거든. 첫 기억이 자기가 서너 살 때 자기 엄마가 한복을 방바닥에 옷감을 놓고 만들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니까 엄마가 못 지내가게 하더라 이거야. 거기에서 배척감을 느낀 거라, 그게 해소가 안되어 가지고 병이 났어. 환자 자신이 그 말을 하고 훽 정신이 돌아오더라. 아주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만성 환자라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싹 증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communication이 근본이다. 정신병인 경우 환자가 말하는 증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다뤄야 돼. Frieda Fromm-Reichmann의 Principles of Intensive Psychotherapy (1950) 거기에도 나오지만 dynamic과 content 증상이라는 게 contents거든, dynamics라는게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치료하면 무슨 증상이든지 다 한꺼번에 없어진다, 정신병이라도. 말하자면 오해가 풀리면 싹 모든 게 다 풀린다. 그러니까 감정을 치료해야지. 서양 사람들은 증상을 가지고 자꾸 interpretation 한다. 적개심과 사랑 받고 싶은 것 그것을 다뤄야 한다.
(편집자 삽입)
** PART II.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THE PATIENT AND THE THERAPIST
VIII. Interpretation and Its Application
1. What To Interpret
a) Contents or Dynamics Special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investig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genetic experience and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the patients' manifestations. This is because these processes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manifestations themselves may be outside patients' awareness.
H : 그러니까 도 정신치료의 요체는 '자비심을 가지고 감정을 다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R : 그렇지
H : 감정이라는 것은 핵심감정인데,
R : 핵심감정은 一擧手 一投足에 박혀있다.
H : 그것은 서양 정신치료자들도 경험 많은 사람들은 비슷하게 나아가는데?
R : 덜 확실하다 핵심감정은 일거수 일투족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감정이다
H : 그리고 치료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비심이 생겨야 된다는 게 도 정신치료에서 특히 강조된다.
R : 그렇지. 서양 사람들은 자비심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고 딴 소리 한다. 자비심 그게 최고의 정신치료다. 무위
H : 서양 정신치료 수련 받는 사람들도 도 정신치료 수련을 받고 쉽게 이해하려면 자기들이 정신치료 받는 걸 잘하고 핵심 감정을 잘 이해하고
R : 그렇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핵심감정을 이해하는 게 부족하지. Central Dynamics다, 그런데 Leon J. Saul이 제일 가깝다. 그는 nuclear emotional constellation이라고 표현한다.
H : 자기들 정신치료를 잘하고 거기에서 더 발전하면 되는데, 간혹 서양 사람들은 도 정신 치료라고 하면 어디 당장에 meditation하는데 찾아 가고 그기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
R : 서양 정신 치료에서 개념, 이론을 빼버리면 다 그 쪽으로 가는 거지, 지적인 것 빼버리면
H : 그건 문화적으로 굉장히 얽매어져 있어서 해결해주기가 힘든 점이 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이 대장암으로 95년도에 편찮으시고 그 다음 1년 후에 간으로 전이가 되어 투병과정을 지켜보면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오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R : 보면 알지. 간 수술하고 병실에 비스듬히 사진 찍은 것 그걸 한번 보지. 그 사진을 보면 얼굴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지
H : 미국에서 수술 마치고 돌아 오셨을 때도 성북동 집에 찾아 갔을 때도 별로 다른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
R : 생사지심을 타파하는 게 그것 아니냐?
R : 지금도 간에 재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 항경련제(Anticonvulsant)가 간에 독성이 있거든.
H : 회복되는 과정이 보통 일반 사람과 다르다.
R : 딴 생각이 없어야 돼. 무심.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돼.
H : 그게 살아오면서 점차 강화가 되었습니까? 원래부터 그런지?
R : 그렇지
H : 자꾸 강화가 되었다.
R : 환자도 자꾸 좋아진다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여서 좋아진다. 안 받아 들여지니까 고통을 느낀다.
H : 정신병 중에 정신 분열증 환자 외에 Bipolar Disorder 환자 정신치료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R : 그것도 핵심감정을 이해하면 재발도 안 한다. 전에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에서 Bipolar Disorder 사례 정신치료 심포지엄 하는데 그 사람들 그걸 모르더라
H : Schizophrenia 환자나 Bipolar 환자나 정신치료 하는 데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R : 무슨 병이든지 감정을 다뤄야 된다. 감정의 장애다. 수도하는 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거다.
R : 오늘 새롭게 인식된 게 있는가?
H : 늘 하신 말씀이지만 감정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R : 감정에 좌우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별로 감정에 좌우 안되지. 옛날부터 우리친구도 나보고 다정한데 냉철하다. 가깝다고 끌리고 그런 것도 없고 나를 공격하는 정신과 의사도 내가 공정하다고 한다.
R : Frieda Fromm-Reichmann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 한쪽으로 발달 단계가 낮아도 다른 한편 어른스런 면이 있다고.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맞게 대해야 된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고 하면 어른 대우 받을라고 하면, 어른스러운 것은 어른으로 대하고 유치한 것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가고 해야 된다. 성장시키는 거라. 정신치료라는 게 성숙시키는 것이다. 어린 부분이 있다고 전부 어린애 취급하면 이것은 성장을 방해하는 거라. 성장된 부분은 성장을 인정하고 어른 대우 해주고 그래야 자란다.
H :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R : 수고 많았어.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