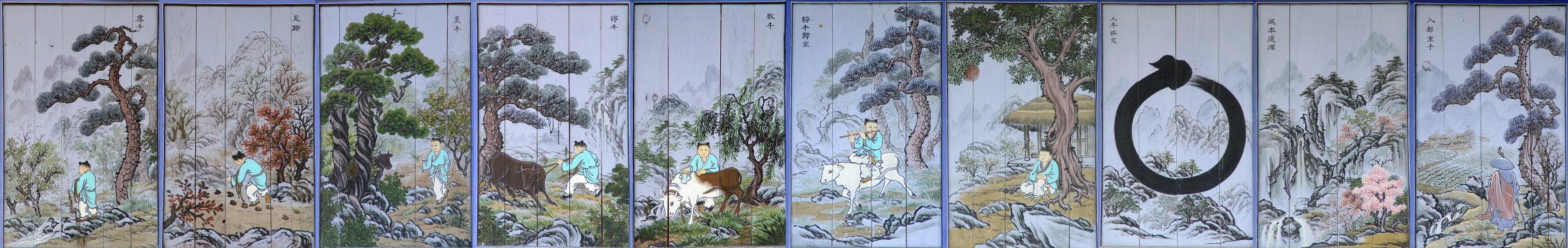한국 정신분석의 발자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22-12-26 16:40본문
한국정신치료학회보 제32권 제4호 2005년 11월
※ 아래 글은 지난 10월 7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있었던 ‘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인간 진실에 이르는 길’에서 이동식 명예회장께서 강연하신 ‘한국 정신분석의 발자취’의 초록입니다. 윤순임 선생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는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Prof. Dr. Rolf Klüwer 초청 정신분석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10월 7일부터 3일간 가졌습니다. (편집 주)
한국 정신분석의 발자취
이동식(명예회장, 동북신경정신과의원)
본인에게 이런 강연을 부탁하신 주최 측의 뜻을 받들어 내가 몸소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증언을 하겠다.
정신분석을 인간심리학이란 체계적 지식, 인간 심리연구의 방법 그리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은 정신분석은 치료에서 출발하고 치료에서 끝난다는 생각 즉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정신분석이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말할까 한다. 지식으로서 아는 단계와 치료로서 실천하는 시기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광복 전에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1938년경에 명주완(明柱完)이 신문에 정신분석을 소개했다는 말을 들었고 정신과 이외의 분야에서도 서양이나 일본서적이나 잡지를 통해서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기타분야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있었으리라 짐작이 되지만 말이나 문헌으로 남은 것은 없었다. 1942년에 내가 경성제대 정신과에 들어갔을 때에는 일본인 교수 조교수 그리고 6.25때 월북한 임문빈 최재혁과 나 한국사람이 셋이고 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명주완 나중에 알고 보니 남명식이 일본 九州대학 정신과에 가있었고 東北大學 정신과 김성희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정신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고 기껏해야 암시 설득요법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전임 초대교수인 久保(구보)가 책을 좋아해서 프로이드 전집 여러 가지 독일학술지가 구비되어 있어 정신병리와 정신분석 정신치료 책으로 공부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물론 정신분석을 한다고 시도한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정도 있었지만은 지금의 표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