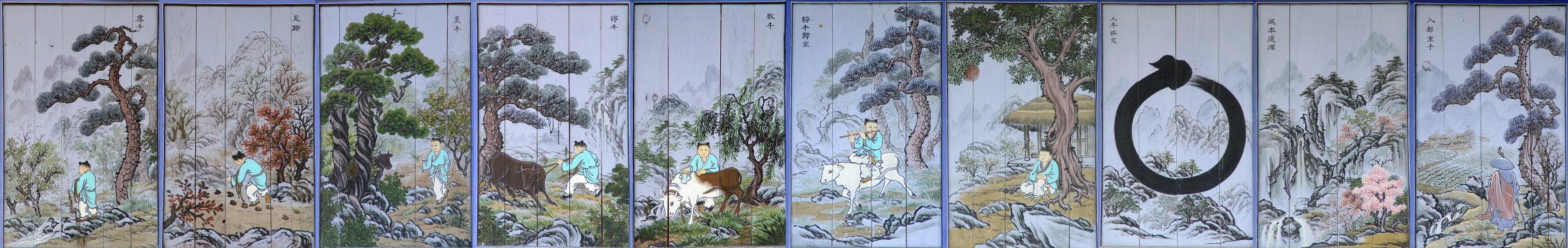화병고(火病考) - 학문(學問)하는 태도(態度) : 對話 제3권 제3호 / 198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3-09-19 13:50본문
[對話 제3권 제3호 / 1986]
화병고(火病考) - 학문(學問)하는 태도(態度)
이 동 식 (한국정신치료학회장)
화병(火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가 홧병으로 죽었다」, 「그것은 홧병이다.」라는 등 무식한 사람들도 쓰는 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정신과의사(精神科醫師)가 되어 정신과(精神科) 환자(患者)를 보면서 체험적으로 오는 것이 정신장애란 대부분이 감정조절이 잘 안되는 것이고 성격이 원인이고 성격은 유전적인 체질에다가 환경 특히 인간적인 환경 즉 가까운 집안 식구 부모형제나 할아버지 할머니 일하는 사람 등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59년 미국(美國)에서 돌아와서 부산에서 제1회(第1回) 대한의학협회(大韓醫學協會) 종합학술대회(綜合學術大會) 때 「정신의학(精神醫學)의 현대적(現代的) 조류(潮流)」라는 특별강연(特別講演)으로 현대정신의학(現代精神醫學)의 흐름과 최신동향(最新動向)을 소개(紹介)했다. 정신약물학(精神藥物學), 뇌화학(腦化學), 동물생태학(動物生態學), 교통정보이론(交通情報理論), 실존정신의학(實存精神醫學), 사회정신의학(社會精神醫學), 동양사상(東洋思想) 등이 다 언급(言及)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을 우리 학계(學界)에서는 15년 이상 뒤에서야 외국문헌(外國文獻)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면서 마치 새로운 지견(知見)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제1회(第1回) 대한의학협회(大韓醫學協會) 종합학술대회(綜合學術大會) 때에 「정신보건(精神保健) 심포지움」을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해 1960년 정월에 지금은 불타서 없어지고 종로예식장(鐘路禮式場)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있었던 서울시 의사회관(醫師會館)에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의협(醫協)에서 회장(會長) 정구충(鄭求忠), 학술부장(學術部長) 김성진(金晟鎭) 두 분이 나왔었다. 이 때 나가서 발표한 것이 「정신보건(精神保健)의 현대적(現代的) 개념(槪念)」이었다. 이 강연에서 “양의(洋醫)는 노이로제 환자가 오면 당신은 병이 없오 하고 한의사(漢醫師)는 화병(火病)이오 해서 한의사(漢醫師)에 가게 된다”고 했더니 이 대목에 가서 김성진씨가 눈이 번쩍하더니 심포지움이 끝나자 다가와서 대한의학협회지(大韓醫學協會) 창간호(創刊號) 원고(原稿)마감이 지났지만 창간호(創刊號)에 싣고 싶으니 오늘 강연한 원고를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창간호(創刊號)에 실려 있다.
그 후 1960년대 초에 의사관계 신문이나 사상계지(思想界誌)에 화병(火病)이라는 말을 썼고 정신과는 화병과(火病科)라는 말도 썼다. 그 후에 김광일(金光日), 이부영(李符永), 이시형(李時炯), 근자(近者)에는 이호영(李鎬榮) 교수(敎授)가 화병(火病)을 한국문화(韓國文化)나 사회(社會)에 특이(特異)한 증후군(症候群)처럼 이야기하고 심지어 화병(禍病)이라는 한자(漢字)까지 사용하는 이조차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화(禍) 자(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辭典)도 찾아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20여년 전부터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로 있는 홍원식(洪元植) 교수(敎授)에게 문의(問議)해서 한의서(漢醫書)에는 화병(火病)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확인(確認)했고 20권(卷)으로 된 대만(臺灣)에서 나온 한문대사전(漢文大辭典)에서는 화(火)는 怒也(노야), 心情躁急曰心火(심정조급왈심화), 「白居易感春詩(백거역감춘시)」 憂喜皆心火榮桔是眼麈(우희개심화영길시안주). 또 於五臟代表心(어오장대표심)으로 나와 있다. 물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우리의 관심사(關心事)에 관계되는 것만 추린 것이다. 즉 화(火)는 노(怒) 또는 조급(躁急), 우희(憂喜)가 다 심화(心火)고 오장(五臟)으로 치면 화(火)는 심(心)에 해당하는 것이다.
13권으로 되어 있는 일본(日本)의 諸橋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도 이와 같고,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의 사전에는 화병(火病)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병(火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대한한사전(大漢韓辭典)이나 한글사전에는 똑같이 화병(火病)이 나오고 화병(火病)은 울화병(鬱火病)이라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다. 울화(鬱火)는 우리나라의 한한사전(漢韓辭典)이나 한글사전에는 속이 답답하여 나는 화 또는 속이 답답하여 나는 심화로 풀이되어 있고 울화병은 울화로 나는 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화병(火病)은 울화병(鬱火病)의 준말로 되어 있다. 흥미 있는 것은 울화(鬱火)나 울화병(鬱火病)은 중국(中國)이나 일본의 사전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사람이 만들어 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울노(鬱怒) 울분(鬱憤)은 있으나 울화(鬱火)는 없다.
울(鬱) 자(字)를 중국(中國)에서 나온 한문대사전(漢文大辭典)에 보면 鬱積也(울적야), 積聚之貌(적취지모) 滯也(체야) 적야(積也) 蘊結也(온결야). 今憂鬱鬱悶皆此義(금우울울민개차의). 울(鬱)은 滯不通也(체불통야), 謂熱氣鬱抑不開也(위열기울억불개야), 暴怒也(폭노야), 기타 愁也(수야) 怨也思也(원야사야) 등의 뜻도 수록되어 있다.
이상 본바와 같이 울화(鬱火)나 울화병(鬱火病) 화병(火病)이라는 말은 중국(中國)이나 일본(日本)의 사전에는 없고 오로지 한국의 한한사전(漢韓辭典)이나 한글사전에만 있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은 한국에만 있고 한의서(漢醫書)에는 없다고 하며 한의사(韓醫師)나 민간(民間)에서나 일반적으로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고 알고 있는 말이다. 화(火)라는 말이 한자(漢字)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 순 한국말인지 아니면 원래의 한국말에 화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漢字)의 화(火)에도 같은 뜻이 있어 화(火) 자(字)를 사용하는지? 또는 한국말에는 화라는 말이 없는데 한자(漢字)의 화(火)에 노(怒)의 뜻이 있어 그대로 우리말이 된 것인지는 국어학자(國語學者)가 밝혀주어야 될 문제다. 현재의 한글사전으로 봐서는 한자(漢字)에서 온 한국말처럼 되어 있다.
요는 화병(火病)이란 말은 한국에만 있는 말이고 주(主)로 화 즉 적개심(敵慨)이 출구(出口)를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병, 더 넓게는 감정처리(感情處理)가 잘 안돼서 생기는 병(病), 더 나아가서는 심인성(心因性) 질환(疾患)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언제 부터인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사용(使用)해 오고 있는 일반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마닐라에서 있었던 제2차(第2次) 태평양정신의학회(太平洋精神醫學會) 때에 UCLA 조교수(助敎授)로 있던 Dr. Lin에게 화병(火病) 얘기를 해주면서 동양의학(東洋醫學)에 관심을 끌게 했더니 그 후에 화병(火病)에 관한 논문원고(論文原稿)를 써서 논평(論評)을 해달라고 보내 왔는데 읽어보지도 못하고 논문(論文)도 어디 두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후에 APA Journal에 화병(火病)에 관한 논문(論文)이 발표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자연과학(自然科學)이나 인문과학(人文科學)을 막론(莫論)하고 논문(論文)을 쓸 때에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구전(口傳)이든 어떤 사소한 기록(記錄)이라도 빠짐없이 듣고 보고 안 후에 자기 자신의 새로운 공헌(貢獻)을 담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것은 무시하고 외국 그것도 전부도 아닌 일부의 것만을 토대(土臺)로 한다든지 더구나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과 다름이 없다 아니면 외국에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마치 외국인에 영합하는 듯,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입장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학문적(學問的)인 예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화병(火病)에 대한 연구태도가 이러한 경향의 하나의 표본(標本)인 것이다.
지난 4월 일본(日本) 동경(東京)에서 있었던 Pacific Rim College of Psychiatrists 모임 우리 말로는 환태평양정신의학원(環太平洋精神醫學院) 모임이라고 할까 모임이 끝나고 작별연(作別宴) 때 연설(演說)을 하라고 해서 「동양(東洋)의 동료(同僚)들은 서양(西洋)의 정신의학(精神醫學)을 철저하게 이해 못하면서 서양정신의학(西洋精神醫學)을 모방만 할려고 하고 자기 문화(文化)를 연구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반면(反面) 서양(西洋)의 동료(同僚)는 동양(東洋)에서 배울려고는 않고 가르치기만 할려고 한다」고 했더니 많은 공감(共感)을 얻고 단상에서 내려오니 젊은 일인(日人)은 best speech라고 환영하는 자(者)도 있고 특별강연(特別講演)을 하는 Papua New Guinea의 Burton G. Burton-Bradley 교수(敎授)는 그 자리에서도 동감(同感)이라고 악수(握手)를 청했고 그 후에 자기(自己) 논문(論文)들과 편지(便紙)를 보내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