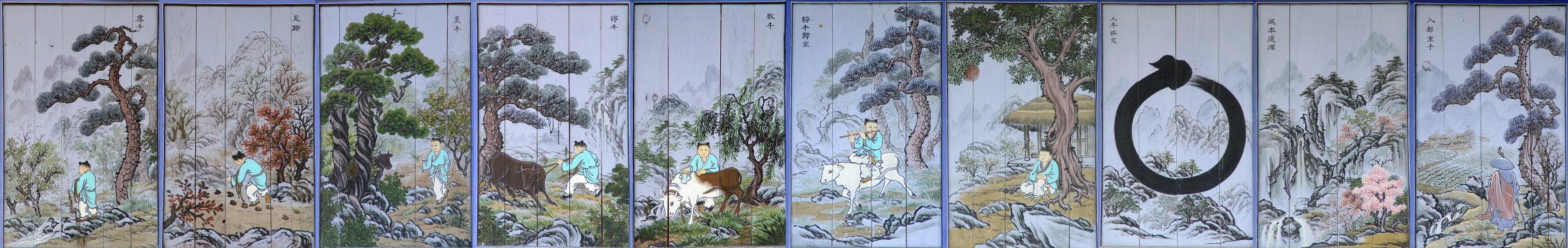美國 精神醫學會 年次大會를 다녀와서 : 한국정신치료학회보 1987년 10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3-09-19 14:22본문
한국정신치료학회보 제14권 제2호 1987년 10월
◎ 卷頭言 ◎
美國 精神醫學會 年次大會를 다녀와서
李 東 植
지난 5월에 美國精神醫學會 年次大會에 가 보았다. 초청장에는 28년간 corresponding fellow로서 學會를 받쳐주어서 고맙다는 外交辭令이 있었다. 外國學者를 위한 리셒션도 4년전보다 빈약해서 미국경제의 쇠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日本서는 4명정도 밖에 안왔는데 한국에서는 10명이나 온 것 같다. 이것도 분은 좀 넘지만 한국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아세아인의 정신과 치료”라는 심포지움에 대만서는 정신치료 얘기는 없고 일본서는 일본의 정신의학회장도 지냈고 15년전 조교수때 한국에 온 바도 있는 현 일본정신분석학회장으로 있는 니시조노(西園)가 일본에서의 치료를 말하면서 일본정신분석학회 회원이 1,000명이나 된다니까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장이고 미국정신분석학회장이며 현 미국정신의학회장인 Georg Pollok이 지정토론을 하면서 미국정신분석학회 회원도 그렇게 안되는데 부럽다고 하길래 내가 西園에게 “일본정신분석학회 회원이 1,000명이나 된다는데 그중에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수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질문을 했다. 사회는 John Spiegel이 맡고 있었다. 그리고 몇해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WPA 심포지움때 내가 질문한 “일본인은 정신분석치료가 안된다는 일본 동료들 견해에 대한 결말을 답변하라”고 했다.
그의 답변은 전혀 답변이 되지 않는 딴 소리만 하고 시간만 흐르니 Spiegel은 단상에서 비웃는 표정으로 니시조노를 등뒤로 보고 있고, Pollok 자기가 견디지 못해 나보고 치료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주제넘게 뛰어든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서 치료과정을 지켜보면 알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Pollok도 계속 딴소리를 늘어 놓으니 Spiegel이 끝이 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Dr. Rhee는 항상 골리기(tease)를 좋아 한다. 아무도 못당한다고 토론을 종결지워버렸다. 끝나고 바아에 가서 한잔 하면서 Spiegel은 「그들은 물음에 답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 하고 야마모도는 「그들은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 했다. Spiegel은 「일본인은 믿을수 없고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뉴욕에 갔더니 정신분석을 하는 한국교포 정신과의사가 살리반학파에 속하는 70대와 60대초의 분석자를 만나달라고 한다. 내과를 하는 제자와 우리집 막내딸이 넷이서 Central Park를 내려다 보는 Schaffner의 Office에 저녁 9시 좀 전에 모였다. 또 하나의 분석자는 Davidson이라는 한국며느리를 봤고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의 Transcultural Research Committee의 Chair를 지냈다고 한다. Schaffner가 내년에 한국에 연구하러 오겠다고 책을 소개해달라고 한다. 중간에 모선생니 내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했다. 내가 과거의 대부분의 Transcultural한 연구가 연구대상이 되는 문화를 잘 이해못하는 외국인이자 연구자의 投射고 自國人의 연구도 서양인의 입장에서 자기나라의 문화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서양인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投射고 妄想이라고 했드니 좀 훔찔하면서 동의한다. 연구비 타먹기, 이름내기, 여행의 교환이 아닌가? 뿌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말에 동의했고 대화가 11시가 좀 지나서까지 가서 돌아갈 길이 멀어서 다음에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精神醫學, 精神治療가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심할 때에는 日本에 까지 매달려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신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를 잘 이해해서 치료하자는 것 보다 졸업장(diploma)이 목적인 것처럼 되어가는 경향이 일부에 있다. 졸업장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치료를 잘하는 것처럼 현혹시키고저 한다. 프랑스의 Lacan은 1950년대에 정통프로이트파에서 쫓겨났었다. 그는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졸업장이 있다고 치료를 잘하고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프로이드나 융이 언제 분석을 받고 졸업장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自明한 것인데 이 明白한 眞理를 받아들이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병을 못고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